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소재 생가

‘아픈 유산이지만 후세에 교육적 자산’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 해 10월28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에 의해 체포된 김재규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1980년 5월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이렇게 김재규가 유명을 달리한 지 어느덧 39년의 세월이 흘렀다.
구미시 선산읍 이문동 선주로를 가다보면 굳게 닫힌 을씨년스러운 한옥집이 한 눈에 들어온다. 굳게 닫힌 철문과 힘없이 팔짱을 낀 기와를 얹힌 흙벽돌담 너머에는 수령이 백년은 훌쩍 넘겼을 듯 한 대여섯 그루의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풍상의 세월을 간신히 이겨내면서 봄햇살 아래 잎새를 조용히 풀어내고 있다.
본채의 양옆에는 두채의 집이 있다. 파편이라도 맞은 듯 유리창 군데군데가 깨져 있고, 은행나무를 낀 공터에는 이름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다.
이곳이 바로 김재규의 생가터다. 풍상의 세월 속에서 시름 시름 앓아누운 백양목을 툭툭치자, 10•26 사태를 일으키고 체포된 아들이 사형되기 직전 흐느꼈던 노모의 잔잔한 음성이 선연하게 들려오는 듯 하다.
“ 혁명을 하려고 살인을 했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울지마라”
노모는 2005년 가슴 맺힌 삶을 마감했다.
생가터는 8백여평 규모,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이곳은 원래 비좁은 곳이었으나, 1975년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아버지 소유의 논을 편입시켜 지금의 생가터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김재규의 일대기를 잘 아는 고인이 된 김오용 옹은 2007년 4월 필자와 만나 이런 회고를 했다.“철저한 불교신자였지. 우리더러 낚시도 못하게 했어. 살아생전 생물을 죽여선 안된다고 했던 사람이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그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 중인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만찬회 석상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시해했으니, 말이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생가는 3억5천만원에 압류돼 국방부 소유로 넘어갔다. 이후 서울에 있는 국방부 땅과 숙명여대 땅이 맞물려 있었는데, 당시 서울의 숙대 땅을 국방부에 편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숙명여대가 김재규 생가를 이전 받았다.
그러나 숙명여대에서 다시 재무부로 넘어간 생가는 재판 결과 다시 유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짚시처럼 떠돌아다닌 끝에 결국 유족의 품으로 돌아온 생가 앞에는 원래 연못을 낀 도랑이었다고 한다. 6.25 당시에는 국군 수색중대가 들이닥치고 피아간에 혈투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로 물들였던 생가 인근은 역사의 비극을 품어안은 곳이라고 지인들은 들려준다.
생가에는 원래 김재규의 군복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형을 당하기 직전 수의 대신 군복을 입고 마지막을 맞겠다는 요청에 따라 이곳의 군복을 가져갔다는 일화까지 전해온다.
2007년 당시 78세인 부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외동딸은 A 모대학 재단이사로 있다고 했다. 여동생과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 김영규 씨는 육사를 졸업한 후 대령으로 예편해 서울에서 번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로부터 12년 세월이 흐른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다. 또 현재 그들의 삶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필자는 다시 세상에 그들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좋든 나쁘든 역사의 현장인 김재규 생가. 풍상의 세월에 깨지고 부서지는 현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07년 당시 고 김오용 옹은 이런 말을 남겼다.
“외국에는 역적의 유산도 보호한다. 가슴 아픈 유산일망정 잘 남겨둬야 후세에 교육적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익명을 요구한 A모 교사는 “아프고 부정적인 역사도 역사인 만큼 그 자체를 후세에 알릴 필요가 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시민 여론을 수렴해 생가 보존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고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훗날, 재야로 돌아오면 냉산에 초가삼간을 지어서 여생을 살고 싶다고 했다던 김재규.그러나 그는 39년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람을 가고 없지만, 그것이 악의든 선의든 암울한 역사를 끌어안은 생가는 세월에 부딪히면서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쓰러져가는 생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보존할런지는 시민과 그들이 쓰고 있는 역사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좋든 나쁘든 후일을 생각하는 역사적인 고증자료의 안목에서 긍정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들어 힘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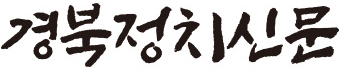





 홈
문화
홈
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