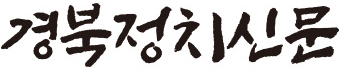-
문화칼럼1> 신살(神殺)과 삶의 지혜(살(殺)속에 살아가는 길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점(長短點)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점(粧點)만 있는 사람은 없고, 단점(斷點)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10/14 10:57 -
국론을 분열시킨 지도자는 늘 불행한 길을 갔다
‘조국 불랙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평화공존의 장이 되어야 할 삶의 현장이 분열과 갈등, 증오와 저주의 싸움터로 전락하고 있다. 잇따른 외세침략으로 국가와 민족의 존립이 풍전등화 (風前燈火)의 위기로 내몰릴 때마다 한민족을 지탱케 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오간 데가 없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10/13 19:58 -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 더 이상 구미를 부끄럽게 해선 안된다
오는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생가에서는 (사)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회장 전병억)가 주관하는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추모제를 겸해 열리는 추도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박정희 대통령 추모단체 관계자등 1천여명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홍 기자 2019/10/12 11:40 -
박정희정신과 경제대국(18)
대한민국은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9달러로 320달러의 북한보다 못 살았고, 춘궁기에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으로 집권한 후 18년 5개월 동안 수출주도와 중화학공업육성, 외자도입 전략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1962년에서 1979년까지 4차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10/06 19:49 -
‘한반도의 新(신) 삼국시대’ 5천년 민족혼이 울부짖고 있다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이다.피어나는 봄꽃들은 앞뒷산을 물들이는데 봄 날 같지가 않다. 2019년, 사지[四肢) 찟긴 ‘민족운명 공동체 한반도’가 울부짖고 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생존의 촌각을 다투는 민심은 살려달라며, 애절한 호소를 보내는데도 정치권은 죽이느니, 살리느니 아귀다툼들이다.
서일주 기자 2019/10/04 10:38 -
시시칼럼 >박정희정신과 중화학공업화(17)
우리 현대사(現代史)에서 부당하게 왜곡당하고 폄훼당하는 시대가 ‘한강의 기적’을 일군 1960년대와 1970년대다. 좌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군 성공의 역사를 수출 일변도의 경제개발, 정경유착 시대로 깎아 내린다. 이승만 정부가 국가의 독립과 국격(國格)의 고수를 위한 ‘정치 제일주의’에 충실했다면, 박정희 정부는 빈곤 퇴치와 경제 자립을 위한 ‘경제 제일주의’에 매진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30 16:17 -
시사칼럼>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기획할 때
인구수와 소득수준은 그 나라 국력의 척도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인당 GDP(국민총소득)가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다.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 중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30-50 클럽’에 가입한 강대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로 가입한 우리나라 뿐이다.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한국이 강국이라는 위상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느끼지 못하고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30 16:14 -
시사칼럼>박정희정신과 구미공단 50주년(15)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낙동강변 경북 선산군 구미읍에 국가산업단지를 세우면서 구미공단은 70, 80년대를 거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가난한 농촌마을이던 구미읍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어 경북 인재의 저수지인 ‘또 다른 대구’가 되었다. 구미는 섬유를 시작으로 가전·반도체·휴대전화·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수출·전자 산업의 고향이며 ‘근대화의 성지(聖地)’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경제 발전 모델로 삼은 박정희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구미공단이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23 15:17 -
시사칼럼>사실에 기반한 세계관, 팩트풀니스(factfulness)
2012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한 사람인 스웨덴의 한스 로울링(Hans Rosling)은 보건의학과 통계학을 바탕으로 그의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팩트풀니스 factfulness, 사실충실성>이란 책을 발표했다. 2019년 올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전 세계 지성인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21 23:24 -
‘조국 후폭풍`, `배를 띄우는 것도 뒤엎는 것도 민심이다’
배를 띄우는 것도 백성이요, 배를 뒤엎는 것도 백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선안된다. 잘못을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정치인의 용기이다.자신보다 상대, 자신보다 국민과 나라를 걱정한 끝에 내리는 용기는 밝은 미래를 향해 길을 내는 힘의 원천이 된다. 그게 마지막 주어진 애국의 길일 수도 있다.
김경홍 기자 2019/09/21 22:59 -
기고>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 의한 112
올해 5월 18일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유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지난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위 신고로 인해 경찰 19명,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다. 국민에 의한 112가 잘못 사용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16 16:10 -
시사칼럼>박정희정신과 광범위한 중산층 형성(14)
류석춘 교수가 몇 년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작업이었다. 청년들 사이엔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없지 않아 “경제발전을 통해 중산층을 만든 부국 대통령”, “새마을운동 성공” 등에 두루 동의했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이 더 많았다. 그들은 “박정희=장기집권을 한 독재자”란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고, “친일파”, “정경유착으로 재벌을 살찌우고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것 등을 과오로 꼽았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16 16:03 -
시사칼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평소 사회 정의와 개혁을 주장해 오던 법학 교수가 장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그의 사적인 삶은 경제적으로 잘 살았지만 윤리적으로 바르지 살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 국민들의 지도자에 대한 불신감 증폭 현상을 야기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14 21:32 -
시사칼럼>박정희정신과 새마을운동(13)
올해로 새마을운동 제창 49주년이 되었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한 새마을운동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대표적인 ‘한류 정책’ 상품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촉발 계기는 바로 ‘자율성의 신장’이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기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정부로서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고 천명했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1970년 초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농민, 관계기관, 지도자 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 자조 노력의 진작 방안’을 연구하라는 특별지시에 의해 태동됐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11 13:18 -
시사칼럼>한국인의 준법 의식
2018연도 통계청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은 ‘자신의 준법 의식’과 ‘다른 사람들의 준법의식’에 관하여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잘 지키고 있다’또는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전체 72.4%로써 자신의 준법 의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긍정 응답 비율은 41.0%로 매우 낮다. 결국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은 법을 잘 지키지만, 자신 외의 다른 많은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회 불신적 법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10 14:31 -
사설>민심일체의 길을 가야 진정한 지도자다
오곡이 무르익는 황금빛 들판을 가로질러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추석같지가 않다. 춘래불사춘이다. 지도자들은 허허실실인데 그를 쳐다보는 민심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민심을 대변하겠노라는 약속을 철썩같이 믿었던 순진함은 바보짓이었단 말인가. 아직도 순진무구한 민심들은 그들이 행복을 듬뿍 담은 바구니를 들고 혹여나 들창문을 두둘기지나 않을까 하고, 밤을 지새워보기도 하지만 창문 밖은 경기 한기가 쌩쌩 몰아치는 살엄음 판이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05 18:19 -
시사칼럼>읽지 않은 필독서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지성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태도이다. 동시에 언제나 무엇이 보다 가치 있는 일인가를 늘 사색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특히 남을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다독(多讀)과 사색(思索)의 두 가지 덕목이 동시에 요구된다. 사색 없는 다독은 비판력을 저하시키고, 다독 없는 사색은 독선을 가져오기 쉽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02 17:13 -
시사칼럼>박정희정신과 산림녹화(12)
중국 춘추시대 명재상인 관중(管仲)은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일년 계획에는 곡식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一年之計 莫如樹穀·일년지계 막여수곡), 10년 계획에는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으며(十年之計 莫如樹木·십년지계 막여수목), 평생을 위한 계획에는 사람을 키우는 것만한 것이 없다(終身之計 莫如樹人·종신지계 막여수인)”고 했다. 각종 임산물 가공 및 고용, 숲이 주는 환경정화 작용, 토사의 유출 및 물 정화 등 현재 우리나라 숲이 주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100조원에 이른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9/01 15:14 -
시사칼럼> 갈등이냐 통합이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미국 하바드대 경제학 팀의 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사회갈등지수>란 지표를 개발 조사 발표하고 있다. 2009년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에 이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0.44)에 비해서도 1.5배정도 높은 수치다. 불필요한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치르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24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1인당 GDP의 27%를 사회 갈등 해소 비용으로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8/27 18:03 -
시사칼럼> 박정희정신과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11)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1950년대에 넉넉한 원조를 제공하다가 1960년대 전반에 원조를 줄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로 하여금 자립적인 새 외화 수입원을 절박하게 찾도록 내몰았다. 궁즉통(窮則通),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수출’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제1차5개년계획(1962~1966)이 반환점을 넘은 1965년경이다. 그해에 박정희는 ‘증산(增産), 수출, 건설’을 3대 국정 목표로 제시하여 ‘수출입국(立國)’ ‘수출 제일주의’를 분명히 했고, 제조업은 20% 전후의 고도성장을 시작했다.
경북정치신문 기자 2019/08/20 15:47